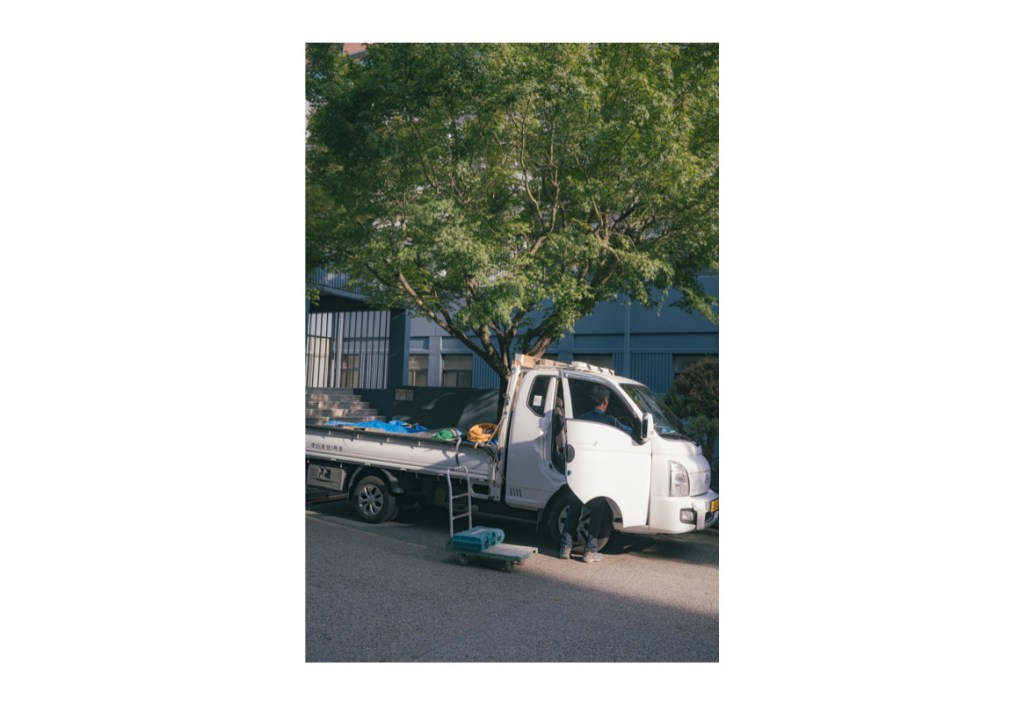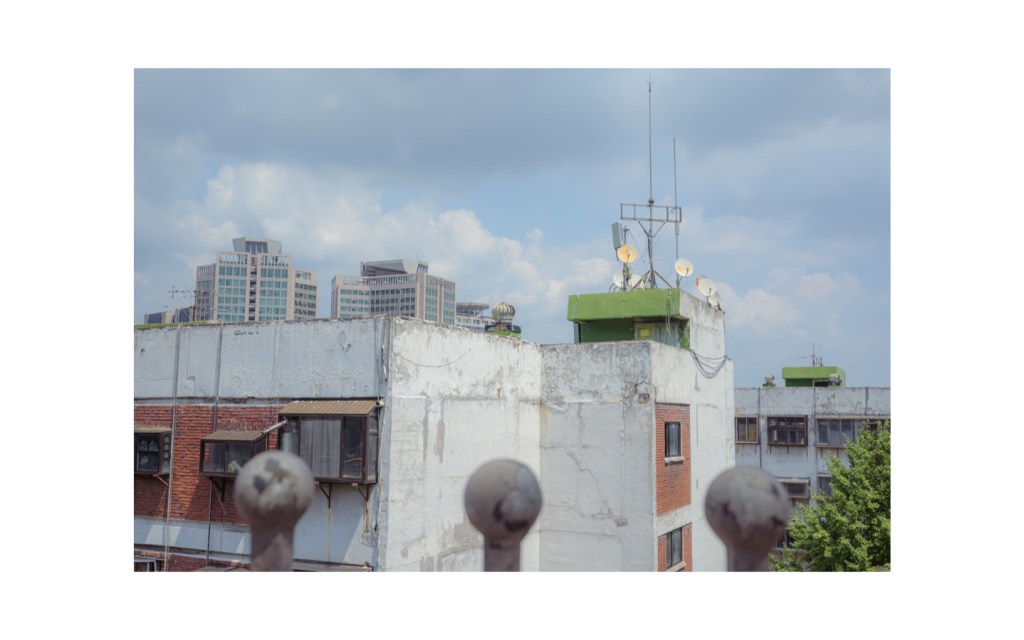오늘의 노트
납기가 가까운 사진들을 집중해서 셀렉했다. 양이 많다. 찍을 때 아쉬운 점도 보인다. 특히 단체사진에서, 아무리 광각에 어두웠더라도 조리개를 조일 걸.. 그런 생각도 든다. 역광이 심했어서.
문제였던 니콘 26미리 렌즈가 그 촬영 날에 분리되었다. 정말 약하게도 만들었다. 그것을 플라스틱용 접착제로 붙였다, 얼마나 더 써볼 수 있을런지? 그런데 그 화각으로 뷰파인더를 보니 약간 편안한 감이 있다.
생각하니 아버지 영정사진으로 쓸 게 없다. 마지막 사진이 93년? 아버지 사진을 준비할 겸 병원에 봉사를 제의할까 생각했다.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몰라서 버거울까 두렵기도 하다. 내일 가면 물어봐야지 생각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나는 보통의 부녀들이 갖는 경험적 기억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중’ 이라고 하면 응당 기대하는 반응을 내가 하기가 어렵다. 또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고민이다. 행정적인 것들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곁에 앉아 당신은 누구인지를 다시 물어야 할지, (그런데 그것은 16세 때 함께 떠났던 남쪽으로의 로드트립에서 해봤던 것 같다. 그리고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던 기억도 난다), 또 지금 몸의 상태를 알려야 할지 등.
우상이 오빠 어머니가 오빠에게 병이 심해진 것을 알리지 않고 있던 중 오빠가 떠났다. 그것이 실수였을까. 내가 하는 건 실수일까?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든다.
수영 중에도 전화가 올까봐 자꾸 신경이 쓰인다.
한시간 정도 수영 다녀오는 일에 죄책감을 느낀다.
죄책감은 힘이 세다.
내가 나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한다.
잘 모르는 사이에 부녀라는 딱지가 붙었다고 돌보아야 한다는 상황은 밖에서 읽으려 한다면 상상은 잘 안된다.
한편으로 그런 상태에서 갖는 감정의 결이나 질이 평생을 붙어 산 사람과 다르다면, 당연한 결과일텐데 이를 검열해야만 할 것 같다.
가벼운 모순들을 마주한다.
이게 작업의 소재가 되려면?
…
아침 다섯시 반의 산책이 나를 구한다.
그 때의 구름이 아름답다.
우선은 그 시간의 그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만족하려 한다.
…
외국은 킨들 배포, 한국은 밀리의 서재부터 차근히.
오늘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