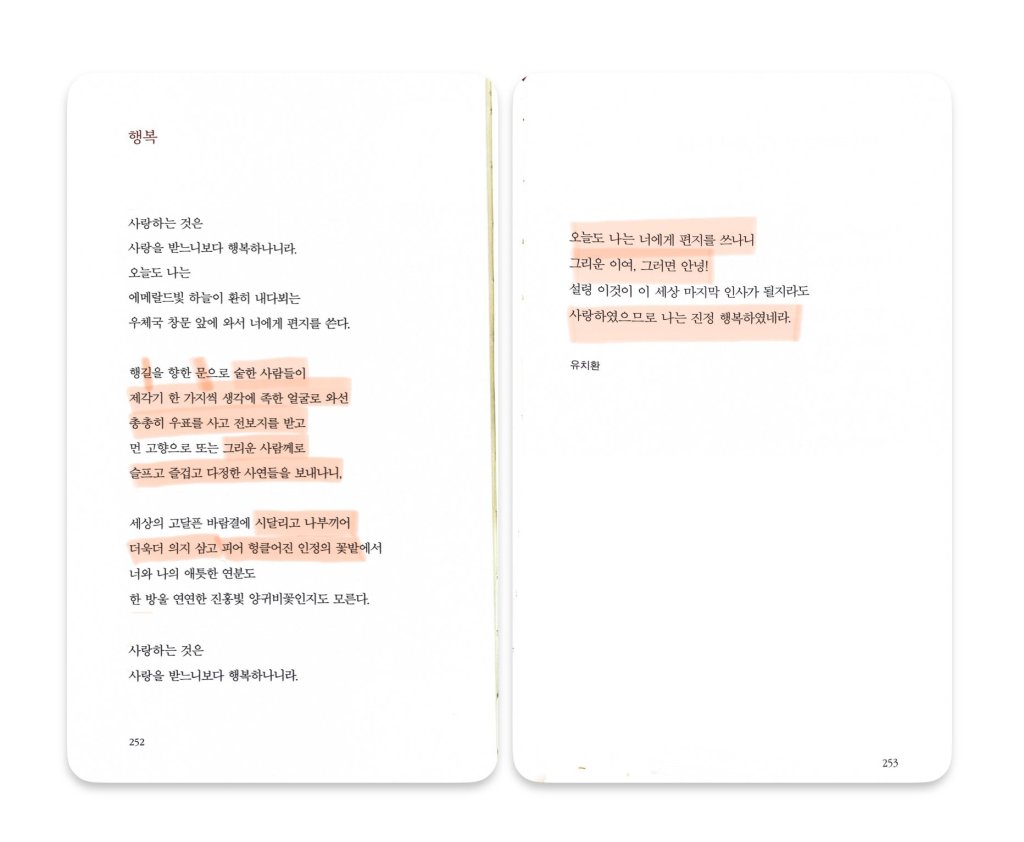내 엽서/편지와 관련된 경험
얘기하려다보면, 어릴 때의 편지나 엽서와 관련된 기억 몇개를 꺼내게 된다.
학교에 가기 전까지 한동안 친척할머니의 충청도 산골 농장에서 살았다. 진학을 위해 다시 서울집으로 왔을 때, 농장의 새로 태어난 병아리들이 마당을 가로지르는 모습이며 나와 함께 자란 강아지와 소의 안부가 적힌 편지를 50대의 여성(할머니)이 끼적댄 삽화와 함께 받았다. 아마 그것이 내 인생의 원거리 편지에 대한 첫 기억일 것이다. 그 전까지 원거리의 안부란 시외전화로 묻는 목소리의 형태였다.
초등학생 어느 생일날, 집으로 엽서가 하나 왔는데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카드형태였다. (아마도 내 생일을 잊었던 것인지… 또는 새로운 방법을 그저 준비한 것인지) 엄마가 그 날 아침에 보낸 전보였다. 그런 의도의 의심이야 지금 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전보로 엽서를 받는다는 경험에 너무나 놀랐다. 지금까지 전보라는 체계가 존재를 한다는 것, 또 이를 보내면 최종 수신인에게는 엽서로 변환되어 [당일에] 도달한다는 것이! 그 신선한 형태와 간결한 내용의 결합은 생각보다 힘이 강해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다.
중학생 때에는 인터넷 활동으로 알게 된 제주도 사는 친구들과 매일 채팅을 하면서도, 펜팔을 하듯 종종 편지를 주고 받았다. 그러다 어느날엔가 그 친구 둘이 함께 미술 수업에서인가 직접 만든 달력을 내게 보내주었다. 그 달력 뭉치를 손에 쥐었을 때, 그와 함께 육지로 올라온 몇장의 편지까지 모두, 그 모든 패키지가 내게는 우정의 물성화 같은 느낌이었다.
고등학생 때에는 바로 근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과 카드를 주고 받으며 ‘나에게 너의 존재란’, ‘너에게 나의 존재란’ 그 관계를 확인하기도 하고, 싸운 뒤 화해하고… 참…
대학생 때에는 여행을 가면, 미래의 나를 수신인으로 삼아 현지에서 편지나 엽서를 사서 집으로 보내곤 했다. 그 때 산 엽서가 신발박스만큼 있다. (음… 이미 나는 이 때부터 엽서를 좋아했던 것이구나, 내게는 하나뿐이니 아까워서 남에게 보내는 데에는 못쓰고 아직 잠들어있다.)
그리고 학교를 떠나 모두 뿔뿔히 흩어진 성인기 초기, 여전히 손글씨의 힘은 유효해서 맥주잔 받침 코스터 뒷면에 적힌 어설픈 쪽지를 발단으로 어느 연애를 시작했고, 해외로 나가 사는 친구들과는 시차를 둔 엽서교환으로 거리와 상관없이 신경쓴다는 마음을 전하고, 때로는 연말연시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글을 적고, 또 선물만 주는 것에 약간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카드를 썼다.
이쯤 쓰고 보니 나는 살짝 헷갈린다.
나는 종이에 적힌 육필의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가, 글의 교환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일까?
肉筆의 함의성에 대하여
흠.. 고민해보자. 우선 나는 글이 교환되며 서로 신경쓰고 챙기는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에 감동을 한다.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은, 종이에 남은 육필의 흔적 그 자체이다.
육필이라는 단어도 대단히 인상적이다. “肉筆” 몸의 근육을 움직여 쓴 글씨. 그의 존재가 실재했다는 것, 그들이 나를 생각했던 시간을 종이에 남은 글이 증명하는 것이다.
때문에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뱃날이면 주던 봉투를 아직 갖고 있다. 그 평생을 쓴 손이 펜을 쥐고, 다분히 훈련된 근육을 사용해, 적당한 필압을 내어, 그들이 정한 내 이름을 성격대로 봉투에 적어가며 “지은”. “지은이 맛있는 거 사먹어라” 라고 쓴 글은, 내게 지금은 아쉽게도 존재할 수 없으나, 과거에 분명히 있던 그들의 애정과 관심어림을 기억하게 해준다.
다정함을 싣고 어디로든 가라
즉 그 단순한 물성이 오늘에는 실재하지 않으며 (관계의 단절이든 생의 소멸이든), 원래도 눈에 보이지 않던 것(마음 씀, 다정함, 사랑, 애정, 관심, 소통, 연결)의 존재를 믿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증거가 없다면, 뒤돌아서면 잊기가 일쑤이며, 재편집 앞에 취약한 기억력을 가진 인간인 나는, 도무지 나를 이만큼 강하게 만들어놓은 그 사랑을 오늘에는 잊었을 수도 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온기어린 공간과 내리 함께한 시간을 통해 주의깊은 마음을 온 몸으로 받았음에도, 더이상 그 송신자가 나의 세계에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적인 소통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있던 그들의 존재를 의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향해 손으로 적은 글은, 시차가 있더라도 시간을 뛰어 넘어 한 생명이 다른 한 생명에게 전할 수 있는 다정함을 오롯이 보관하며 전한다고 볼 수 있고… 나는 그런 ‘보내고 받는 편지’ 중에서도 내 사진이 적합한 ‘사진엽서’를 매체로 선택했다.
내 사진이 그의 등에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이 담긴 그 흔적을 업고, 지구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은 꼭 ‘내 분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전하는 것만 같은 느낌도 든다 (홍길동 호잇, 아 홍길동이 아닌가.. 손오공인가..).
엽서 = 情 전달체, 情 = 인간의 무한동력
세상에 나와 자립하느라 애를 쓰며 내버티던 시기, 내가 그동안 편지와 엽서를 통해 받은 우정과 사랑은, 언제 꺼내먹어도 다음에 볼 때면 늘 그만큼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나 역시 친구들에게 글을 써서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했는데, 그러고나면 나의 마음은 더 다분히 좋은 쪽으로 향해있었다.
흠.. 세속적인 표현을 해볼까? 보내는 사람은 정성을 들여 글로 쓰고 전달하는 그 시간 동안 꽤 행복하고, 또 받는 사람은 그 이후로 계속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하나 써서 이정도면 무한동력 버금가는 것 아닌가… 쨌든 사람이 계속 움직이려면 필요하니까, 정情 이. (우리는 외롭고 고립된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를 잘 안다.)
여기까지 보자면, 나는 사진엽서를 통해 좀더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 자주, 더 쉽게, 표현하므로서 마음이 좀더 촉촉하고 건강하게 말랑이도록, 연결고리를 해체하지 않고 결국 약하든 강하든 어느정도는 연결되어 공존하며 의지하고 살도록, 그러므로서 서로에게 조금씩은 속하도록 돕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육필로 남긴 엽서나 카드가 존재의 증거가 되어, 언제고 꺼내보므로서 그 상호작용의 감정이 재생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살만할 것 같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또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련의 고민과 활동이 의미 있는 노력의 투입이지 않을까.
편지 관련 시를 하나 찾았다
카페에 비치된 책을 후루룩 읽다 마지막에 보았다.
일부 내 생각이랑 맞닿는 부분이 있어 갈무리 해놓는다.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을 보내나니’
‘세상의 …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유치환 시인의 행복인데, 저 하이라이팅 한 부분이 내가 하고 싶던 얘기의 다른 부분과 비슷하다.
(오늘 글은 너무 육필에 치중한 감이 있는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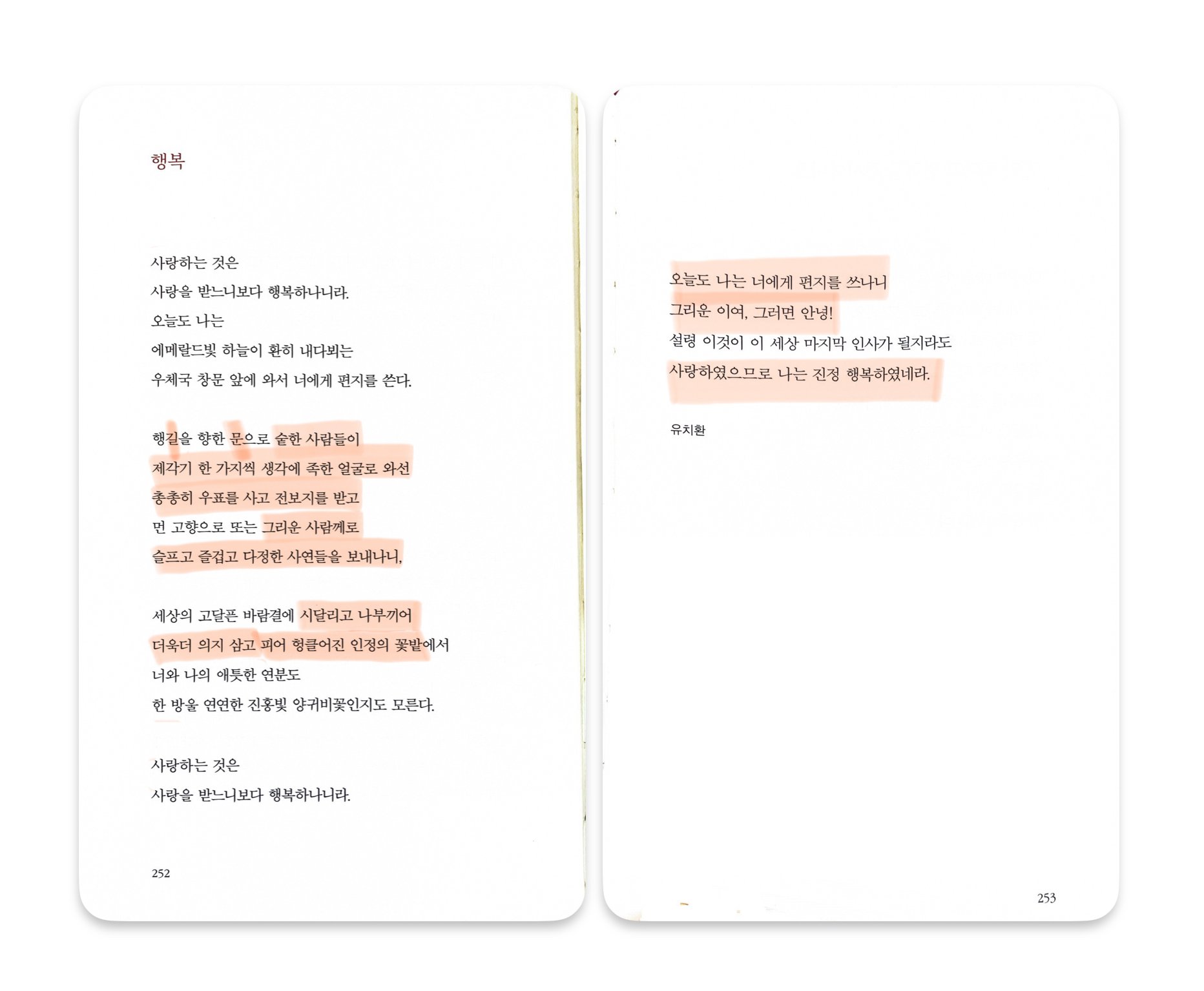
수록본 출처: 나태주.(2020).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앤드. pp 252 – 253
오늘은 이것은 (사진)엽서의 기능적 측면에서 스스로를 설득하듯 생각해보았고,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사람들이 내 사진 엽서를 쓰게 될까? 라는 측면에서 한번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만들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