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눈 쌓인 설날


2) 우리집 흰 고양이
22년에도 내 사진기는 거의 우리집 고양이만 찍었다. 이정도로 집-회사만 했다니.. 이 시기의 기억이 거의 사무실인 이유가 이거였다.
작은 사진집으로 정리를 해놓을까 싶은 생각에 찾아보면, 또 고양이 표정이나 조명이 비슷비슷해서 그러기에는 폭이 좁은 것 같아서 쩝.
이 때에 고양이 사진 찍기 기술이 그 전보다 늘었던 것 같다. 표준 계열이 고양이에게 집중하기에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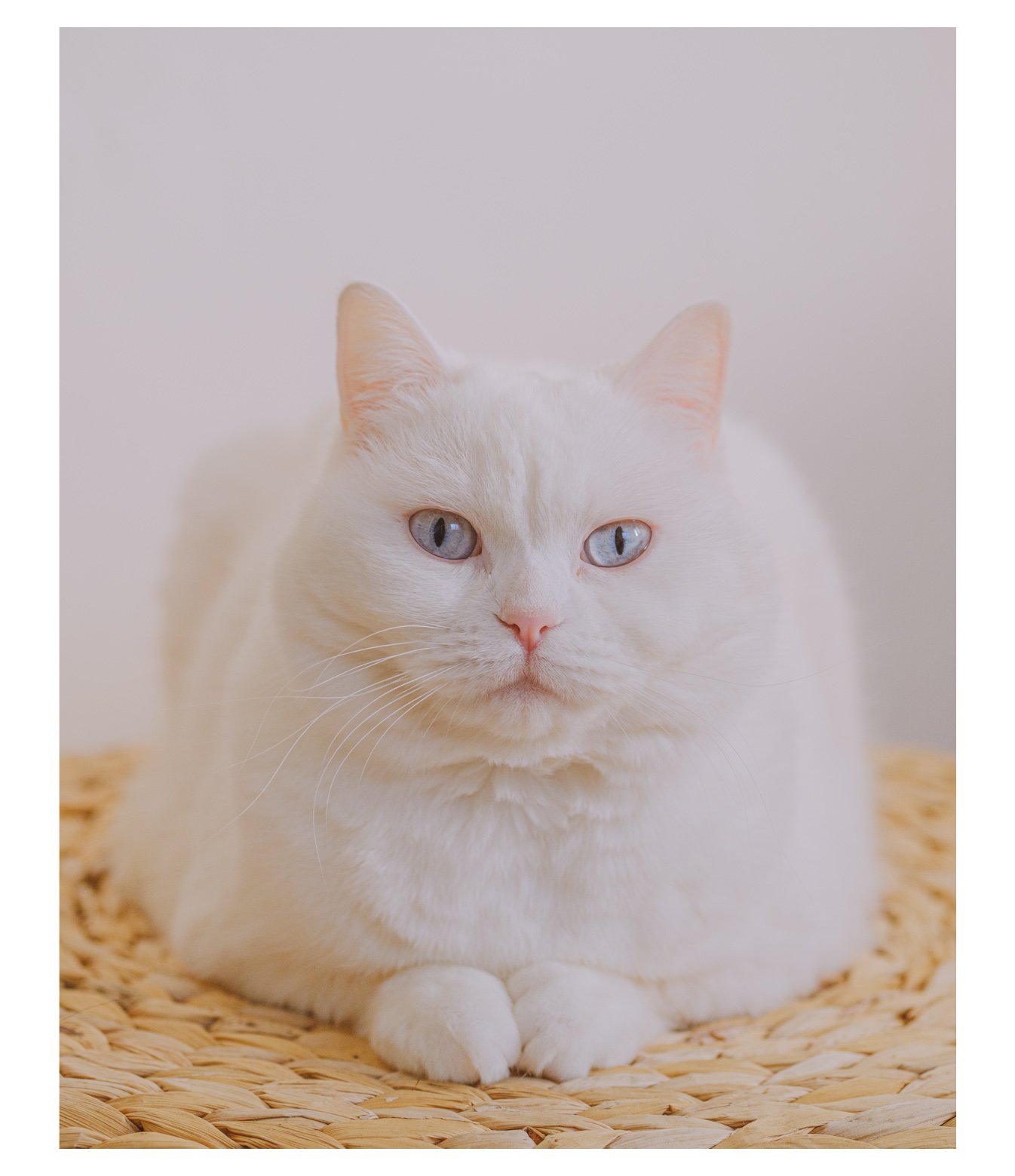














3) 요리
집과 회사만 오가는 일-좀비에게 취미란, 먹고 마시는 것 뿐.
나의 스트레스는 도시락 싸기로 풀었다.
다만 22년도 상반기는 프로젝트 두개를 연달아 하면서 쉬는 시간 없이 업무에 상당히 큰 부하가 걸리기 시작한 때라 (기본 집출발 7-9시, 집도착 23시-26시 느낌.) 술은 손에도 못대고, 주로 차를 마셨다. 와인잔에 든 것은 숙차이고, 작은 주전자에 든 것은 생차이다.




4) 오늘날에 돌아보기에
스타트업 업계에서 노동자로 사는 동안 뒤돌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 시간과 노력과 체력과 지력을 모두 다 쏟아부었다. 엄밀히 말해 계약서 이상의 노력이었지만 그 때엔 그저 해내는 것만이 생존과 출구전략인 것 같았다. 해내지 않는다면 탈락이다, 라는 생각이 맺혀있는 듯이 나는 성장에 절박했다.
선택과 집중 덕에 나는 처음에 업계에 들어갈 때 생각했던 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시장에서 회사문을 열고 들어가, 성장과 쇠락을 거쳐 가능하다면 폐업이라는 기업의 마지막도 본다”는 시나리오를 경험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소행성을 관찰하므로서 기업이라는 별이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의 생애를 fast-forwarding한 형태로 직접 참여하며 관찰하기를 바랐던 것인지도.
그 시나리오 가운데에서는 나에게 아래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 영역을 레쥬메에 잘 좀 쓰라고 충고하여, 먼저 여기에 정리해본다
- 사업의 런칭 전, pre 0 단계에서부터 시리즈 B까지 받는 과정에 이르기까지를 거치면서 직원 1명에서 100명으로 확장되는 경험 (백커가 소뱅코리아라고 말하면 이 멘트의 힘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다..)
- 그저 앞에 문제가 있다면 치우고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국 땅과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인도 광고 카운터파트너들이랑 협업하던 거나 중화 영업직에게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자고 달리해보자고 바꾸자고 설득하고 맞춤형으로 시스템 구조화하고
- 정량만 극도로 드릴다운 했던 신방 석사시기를 뒤로하고 정성 리서치의 맛에 빠져들고; 여러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거나 줌콜로나 서베이를 통해서나 ‘왜 (안)써요’를 구하기 위한 질문을 설계하고 답을 여러 각도에서 구해는 것처럼
- 리서치만 알았는데 분석도 하게되고; 데이터 구조를 연구하듯 파서 CRM 파이프라인 설계하고, SQL과 Tableau 같은 분석 툴이라면 대체로 몇시간-몇일 투자하면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고, 지표의 수식화가 술술술 되는 마법..
- 스타트업 노동자로 살다 직장을 옮겨서 다른 스타트업들 인큐베이팅을 하러 다니고,
- 그러다 거시 경제의 흐름에 부딪히며 폐업에 이르기까지.
위에 쓴 내용이, 생략한 9+년의 모든 경험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이게 대체 어느 직무로서 정의될지도 이제는 더 불명확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적어도 업무에서만큼은 ‘아 너무 대충했네 게을렀다’와 같은 깊은 후회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정도로, 내가 시간과 체력과 노력과 머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그 안에서 만큼은, 최선을 했다. 그 순간들이 낭비되면 안되겠어서, 정확히는 그 때 그렇게 집중해야만 회사도 살아남고 나도 다음이 약속되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다. 그렇게 오늘에도 귀중하게 쓰이는 경험을 만들어왔고, 내 학부전공(사진)이나 성향과는 전혀 다른 영역의 사고방식과 능력도 짧은 시간 안에 밀도있게 계발되었다.
그치만 구조나 의도보다는 상황이 주도하는 형태로 했던 만큼, 실수도 많았고 뒤늦은 깨달음과 부끄러움도 그만큼 뒤따라 왔다. 그리고 위의 일들이 그냥 내가 잘해서 된 거겠나. 회사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또 참아주고, 덮어주고, 해 봐라 기회를 어느정도 주니까 그래도 내게 뭐 희망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체력이 받쳐주는 딱 그만큼 주먹쥐고 버티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돌아보자면 내 남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근거없을 희망은 다 떨궈내야 한다. 더이상 직무적 수행은 멈췄지만 지난 경험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지금에 자주 생각하는 주제라면, 앞으로도 이전과 동일한 영역을 선택하고 이에 집중하는 것이 유효한 수준의 배움을 줄까? 이다. 매일 이를 주제로 일기를 쓴다. 질문은 매번 다르며 오늘의 질문은,
”나는 지난 9+년간의 경험으로 뭘 배웠고, 아쉽고, 반성하나? 좋고 싫은 부분은 무엇이었나? 전략적으로는 어디까지 의도였고, 어디서부터 운이었으며, 악수였나? 왜 그 악수를 선택하게 되었나.”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할 선택이 제일 좋은 선택이라면, 또 그런 후회가 있더라도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구체적일수록 결국은 실현에 가까워진다면, 나는 뭘 원하지? 무슨 상상을 하고 싶지?”
…그 원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의 형태와 같은가?
…평일날 낮의 바깥을 볼 일이 없어서, 낮에 찍은 사진이 하나 없는 삶을 내가 원하나?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진 것(능력/실력, 경험, 태도, 성향, 자산)으로 레버리지가 되는 영역인가
…충분히 내게 의미가 있거나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의 일이나 영역이나 활동인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를 고민해볼 수 있는 이런 물음을, 여러 다른 형태로 바꿔서 던져가며 스스로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 중이다.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방황할 수 있어서, 이럴 수 있어서 감사하다.
5) 연하장용 사진엽서 테스트를 맡김


먼저 사진 고르는 게 고민이었다.
내가 여행사진을 좋아하니, 최근에 다녀온 설악산 촬영분과 타이베이 촬영분에서 골랐다. 초록을 보는 게 요즘 즐거워서 그런 기조로 생각했다. 테스터 뽑은 다음에 디자인에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5개정도 더 뽑아보려고 한다.
두번째로는 사이즈를 고민했다.
일전에 긴 변 길이가 26센티가 되는 수준으로 만들었던 엽서를 선물하면 ‘사진이 커서 좋은 반면에 글을 쓰기에 부담스럽다, 다 채울 게…’라는 반응도 있었어서, 이번에는 그 엽서의 절반 크기로 만들었다.
정확한 사이즈는 9.5 cm * 13 cm 이다.
보통 엽서는 10cm * 14cm가 일반적이라서 큰 차이는 안나지만, 그래도 비율이 갖는 차이가 있으니, 테스트 삼아서 조금 작게 해본 셈이다.
세번째로는 앞면 프레임 굵기와 뒷면 디자인을 고민했다.
프레임 굵기는 10cm * 14cm일 때에는 5mm, 10mm 등으로 테스트 뽑아서 주변 반응을 봤는데 얇은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서, 이번에는 3mm 선으로 해봤다. 과연 출력소에서 오류 없이 잘 만들어주실지.. 가 좀더 변수인 것 같다.
뒷면 디자인은 주소 적을 선을 넣을 것인가, 우표 붙일 자리를 미리 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참 하다가 우표나 주소 모두, 이게 직접 줄지 보낼지 모르는 상황이라, 주소 부분을 강제로 넣어놓는 것이 엽서의 사이즈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과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우측 이미지처럼 사진촬영지 정보와 해당 사진 시리즈를 볼 수 있는 QR코드를 넣었는데.. 그 이유는 예전 고등학교 친구가 ‘이건 어디서 찍었어?’라고 항상 궁금해 해줬던 기억 때문이다.
다만 엽서 사이즈가 작고, 또 글 쓸 영역을 크게 넓게 확보하고 싶어서 QR코드는 여러 테스트 후에 최소사이즈로 보이는 수준으로 넣었고 색상도 opacity 30% 정도로 잡았다. 작성자의 편지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과연 제대로 QR코드가 작동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post card 라는 단어를 상단에 넣어봤다.
많이 고민하다가 넣었다. 좀 몸에 전율 같은 게 살짝 올라왔다. 맞아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지, 라고.
뭘 이걸 고민해? 싶지만, 나는.. 내가 ‘뭘 원해’라고 말하는 경험이 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동안 내가 ‘사진엽서’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내 사진이 컴퓨터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메세지를 등에 업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빛을 좀 쬐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가 만든 게 내 스스로 진짜 “엽서”야, 라고 하는 게, 그걸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게 좀 어색했다.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컨펌을 받지 않고,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게. 이렇게 작은 건데도, 나는 왜 그렇게 망설이는지. 그 이름을 누구의 허락도 없었지만, 내가 붙이고 보니, 그렇게 만들고 보니, 기뻤다. “아 맞아, 이거야,” 라고 생각하며 좋았다.
내가 원하는 것임에도 모른척하거나 이르다고 스스로를 타이르거나 부족하다고 하다가, 그냥 툭, 하고 했는데, 영 나쁘지는 않더라.
사실은 좋더라.
